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밟고, 자음군 단순화 순서?
- ‘밟고’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나는 걸까요?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인지, 된소리되기가 먼저인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 실제 국어 규칙에 따라 설명해요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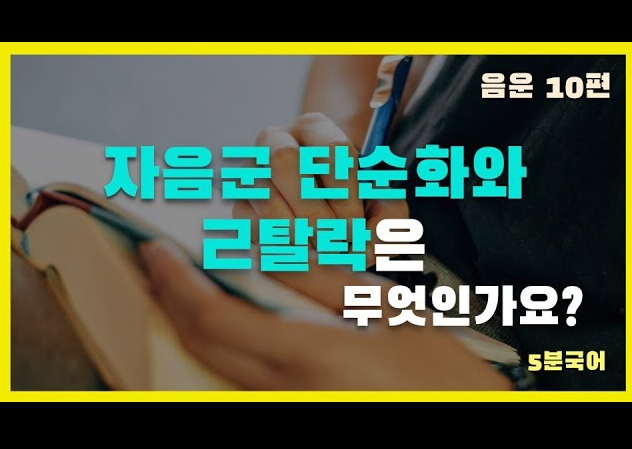
1. 질문 요약: ‘밟고’의 음운 변동 순서는?
- 질문자님께서는 ‘밟고’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, ‘밟꼬’처럼 된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나고, 이후에 ‘밥꼬’처럼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셨습니다. 실제 정답지에서는 ‘자음군 단순화 → 된소리되기’ 순서라고 제시되어 틀리셨다고 하셨고요.
2. ‘밟고’의 원형과 발음
- 우선 ‘밟고’는 어간 ‘밟-’과 연결 어미 ‘-고’가 합쳐진 형태입니다. 이때 어간 말미의 자음군 ‘ㄼ’이 문제의 핵심입니다. 국어에서 자음군이 받침에 올 경우, 발음상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음운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.
3. 정확한 음운 변동의 순서
정답지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.
① 자음군 단순화: ‘밟고’ → ‘밥고’
여기서 자음군 ‘ㄼ’이 ‘ㅂ’으로 단순화됩니다. 국어 규범상, ‘ㄼ’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대부분 ‘ㅂ’으로 소리 납니다. (예외도 존재)
② 된소리되기: ‘밥고’ → ‘밥꼬’
뒤에 오는 평음 ‘ㄱ’이 앞의 받침 ‘ㅂ’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 ‘ㄲ’으로 변합니다. 이는 된소리되기 현상입니다.
👉 따라서 정확한 음운 변동 순서는 자음군 단순화 → 된소리되기입니다.
4. 왜 된소리되기가 먼저가 아니죠?
- 질문자님처럼 ‘밟고’에서 먼저 된소리가 되어 ‘밟꼬’가 되고, 이후에 ‘밥꼬’가 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국어 음운 변동의 규칙은 ‘형태소 내부 → 형태소 경계’ 순서로 작용합니다.
- 즉, 먼저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, 형태소 경계에서 생기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됩니다. 이 순서는 국어 음운론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.
5. 예외는 없나요?
- 모든 단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자음군 ‘ㄼ’이 받침으로 올 때 ‘ㄹ’이 발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. 예: ‘밟다’는 ‘밥따’가 아니라 ‘발따’로 소리 납니다. 이는 'ㄼ' 뒤에 'ㄷ'이 올 때는 ‘ㄹ’ 발음이 남는다는 특수한 경우입니다.
- 하지만 ‘밟고’는 ‘ㄱ’이 뒤에 오기 때문에 ‘ㄼ’이 ‘ㅂ’으로 소리 나는 게 맞습니다.
📌 결론
- ‘밟고’는 음운 변동 순서상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되어 ‘밥고’가 되겠습니다.
- 이후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‘밥꼬’가 되겠습니다.
- 국어 음운 변동은 형태소 내부의 변화(자음군 단순화)가 형태소 경계의 변화(된소리되기)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해석은 아쉽지만 규칙과는 다르겠습니다.
- 이와 같은 규칙은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나 국립국어원 자료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겠습니다.
📚 출처
『고등학교 국어』 교과서 (미래엔, 비상 등 공통 내용 기준)
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
국립국어원 “우리말샘” 음운 변동 설명 자료
반응형
